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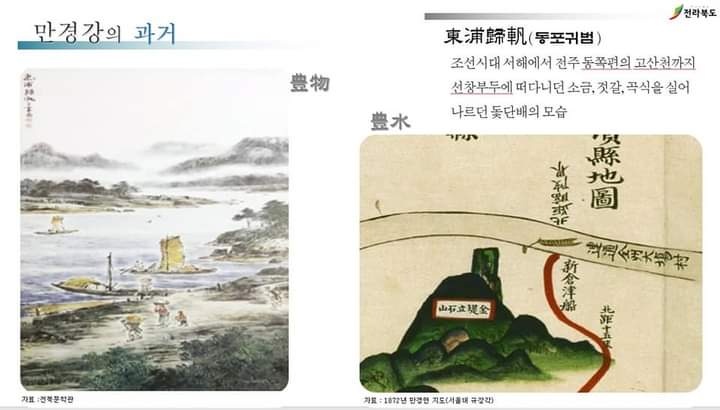

‘신창진의 도중에서 짓다[新倉津途中作]’
신창진은 세 읍이 모이는 곳으로 / 新倉三邑會
웅령에서 처음 수원이 발하였는데 / 熊嶺初發源
조수가 들어오고 또 나가곤 하여 / 潮生復潮落
밤낮으로 끊임없이 흐르도다 / 日夕流渾渾
원근의 숲들은 마치 부추와 같아서 / 遠近樹如薺
갈대 부들만 번성할 뿐이 아니요 / 不獨萑蒲蕃
기러기 오리는 개 닭과 섞이었는데 / 雁鶩雜鷄狗
고기잡이 집들이 마을을 이루었네 / 漁戶自成村
기름진 토지는 몇 만 이랑이나 되는지 / 腴田幾萬頃
아득히 바다 어귀에 닿았으니 / 蒼茫接海門
호남은 본디 벼곡식이 풍부하지만 / 湖南富秔稻
취야를 의당 으뜸으로 논해야겠네 / 鷲野宜首論
내가 와서 성한 더위를 만났는데 / 我來觸隆赩
높은 누각이 무너진 담장 눌러 있어 / 高樓壓頹垣
높은 데 올라 찬 오얏을 먹으니 / 憑危嚼氷李
순식간에 답답증이 제거되누나 / 倐爾蠲煩寃
길이 자안의 글귀를 읊노니 / 長吟子安句
이 천원이 내 눈을 놀라게 하는데 / 駭矚玆川原
편편이 날아 서쪽으로 가는 학은 / 翩翩西歸鶴
내려다보며 길이 말을 하는 듯하네 / 下顧似長言
구름 연기가 해도에 덮이었는데 / 雲煙冪海島
바람이 불어 구름 연기 환히 걷히니 / 砉然風披掀
봉래산은 전체가 맑고 깨끗한데 / 蓬萊盡澄澈
십주는 멀리 한 점일 뿐이로다 / 十洲夐一痕
손을 들어 나는 신선이 되려 하는데 / 擧手我欲仙
마부가 가는 수레를 묶어 놓았네 / 僕夫縻征軒
이 천원이……놀라게 하는데: 자안(子安)은 초당(初唐)의 문장가인 왕발(王勃)의 자인데, 그의 등왕각서(滕王閣序)에 “산원은 광활하여 시야에 가득차고, 천택은 눈이 떡벌어져라 보는 눈을 놀라게 하도다.[山原曠其盈視 川澤盱其駭矚]” 한 데서 온 말입니다.
전라감사를 역인한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이 ‘김제 신창진에 들려 시(新倉津途中作)’를 남겨 이 이전에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직은 시에서 신창진은 '세 읍이 모이는 곳(新倉三邑會)'이라고 했고 조선 팔도의 노래에서도 신창원(新倉院)을 챙기고 있듯이 해.육상의 교통요충지였습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신창진(新倉津) : 서쪽 70리에 있으며, 김제와는 남쪽으로 20리 거리입니다. 이 시의 세 고을은 전주, 만경, 임피를 가리킵니다. 바로 이곳엔 누각이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전라도 임피현(臨陂縣) 신창진원루(新倉津院樓), 지금의 전라북도 옥구군(沃溝郡) 임피면 만경강 일대의 있었던 원의 누각입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4권 전라도(全羅道) 임피현(臨陂縣)편에 신창진(新倉津)은 남쪽으로 20리이며, 사수(泗水)의 하류이고, 김제ㆍ만경과 통합니다. 신창원(新倉院) 신창진의 언덕에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곳 신창진원에는 누각이 있었습니다. 열조시집(列朝詩集)에 "조선에서는 당송(唐宋)의 고사(故事)를 따라서 역정(驛亭)마다 모두 관기(官妓)를 두었는데...."라고 했듯이 역에는 누각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누각명을 거의 모은다는 사실입니다.
임진난 의병 고경명이 이곳에 들려 원은 만경 북쪽(在萬頃北)에 있었다고 이르고 생애 말년에 회후에 찬 시(題新倉津院樓)를 남겼습니다.
쓰고 단 세상 맛 두루 맛보니 / 머리만 희게 되는 걱정 뿐이로세
강관(江關)에서 짓는 시 씁쓸하기만 하고/경락(京輦)의 옛 친구들 점점 멀어지네
世味辛甘略遍嘗 半生憂患鬢蒼浪 江關詞賦空蕭瑟 京輦交游轉渺茫
세번이나 꺾인 팔 더 꺽인 것도 없지만 /아홉구비 간장이 꼬부라지는 듯하오
가을철 나그네길 서해까지 이르러 / 높은 누에 혼자 올라 석양만 바라보노라
三折已無堪折臂 九回猶有剩回腸 秋風客路遵西海 天畔高樓倚夕陽
고경명이 이곳에 다녀간 것은 그의 아들 고종후(高從厚 1554~1593)가 당시의 임피 현령(臨陂縣令)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김종직이 읊은 전북 관련 시입니다.
완산의 만경대에 올라 세 수를 읊다[登完山萬景臺三首]
층대가 산꼭대기까지 모두가 암석이라 / 層臺通頂盡巖嶅
말에서 내려 걸음걸음 높은 데로 올라가니 / 卸馬登臨步步高
진포는 아득히 학의 물가에 연하였고 / 鎭浦微茫連鶴渚
변산은 희미하게 큰 바다에 꽂히었네 / 邊山隱約揷鯨濤
기이함 찾는 건 방일한 시 생각에 의지커니와 / 搜奇政倚詩魂橫
먼 데를 바라보매 어찌 눈 피로함을 사양하랴 / 望遠何辭眼力勞
오래 앉았으매 청풍이 두 겨드랑이에 나오니 / 坐久淸風生兩腋
서왕모에게서 빙도를 얻어먹은 듯하구나 / 擬從金母嚼氷桃
만 길 봉우리의 성문을 두루 보면서 / 流眺城闉萬仞岡
남고사 안에 승상을 빌려 앉았노라니 / 南高寺裏借繩床
강산의 웅장 수려함은 한토인 줄 알겠고 / 江山雄麗知韓土
들쭉날쭉한 누관들은 패향이라 일컫누나 / 樓觀參差稱沛鄕
천 두둑 밀 보리는 초여름을 바라보고 / 千隴來牟將孟夏
몇 집의 가취 소리엔 석양이 되어 가네 / 幾家歌吹欲斜陽
굳이 흥망 성쇠의 일을 논할 것이 없어라 / 不須料理興衰事
오늘의 번화함은 사방에 으뜸이라오 / 今日繁華冠四方
이 년의 직무 속에 귀밑이 희어졌는데 / 二年簿領鬢成絲
돌산 봉우리에서 술잔을 손에 쥐니 / 犖确峯頭把酒巵
푸른 눈의 선승은 채소 다발을 제공하고 / 碧眼禪僧供菜把
빨간 치마 기녀는 꽃가지를 꼬는구나 / 蒨裙歌妓撚花枝
버들꽃은 봄날의 개인 뒤에 성해지고 / 柳綿撲撲春晴後
소나무 이슬은 해 저문 때에 내리도다 / 松露霏霏日仄時
한가롭게 노니는 것을 괴이타 여기지 마소 / 莫怪優游仍嘯傲
부절 깃대 다 떨어지고 임기가 찼다오 / 節旄落盡及苽期
승상 : 새끼줄을 맨 의자를 말한다.
패향 : 본디 한 고조(漢高祖)의 고향인데, 여기서는 이 태조(李太祖)의 선대(先代)가 전주 이씨(全州李氏)이기 때문에 전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완산에서 춘흥에 대하여 세 수를 읊다[完山春興三首]
번화함이 옛날 견훤이 도읍한 때보다 나아라 / 繁華却勝甄都舊
복사꽃 오얏꽃이 온통 금수의 집을 이루었네 / 桃李渾成錦繡家
꽃구경 하기엔 두 눈 껄끄러움이 괴로운데 / 惱殺看花雙眼澁
시를 쓰노라니 또 글자는 까맣게 되는구나 / 探詩猶有字如鴉
제남정 북쪽으로 석귀의 골목에 / 濟南亭北石龜巷
수양버들 늘어진 소소의 집을 가리키어라 / 指點垂楊蘇小家
삼삼오오 탕아들은 오화마를 타고서 / 三三遊冶五花馬
성루의 저녁 까마귀를 서글피 바라보네 / 悵望城樓日暮鴉
붉고 흰 꽃들이 수놓은 비단 이루었는데 / 朱朱白白花成罽
가랑비는 수만 가호에 자욱이 내리누나 / 煙雨空濛數萬家
머무른 시일의 많고 적음을 묻지 마소 / 莫問淹留日多少
성 남쪽 나뭇잎이 벌써 까마귀를 감추었네 / 城南樹葉已藏鴉
소소는 남제(南齊) 때 전당(錢塘)의 명기(名妓)의 이름인데, 전하여 기생을 가리킨 말이다.
전주향교의 만화루에서 차운하다[全州鄕校萬化樓次韻]
학교는 공자의 궐리 학당과 방불하고 / 庠序依俙闕里堂
유생들은 모두 초 나라 인재 진량이로다 / 藏修盡是楚材良
연어는 활발하게 하늘과 땅을 나누었고 / 鳶魚活活分天地
현가 소리는 양양하게 담 밖으로 퍼지누나 / 絃誦洋洋殷堵墻
물이 방지에 출렁이니 가슴속은 맑아지고 / 水灔芳池襟抱淨
바람이 문행을 흔드니 담소는 시원하여라 / 風搖文杏笑談涼
일 년 동안 내 유생을 고무시킬 꾀 없었으니 / 一年鼓舞吾無術
누 앞의 유하의 배항들에게 부끄럽구나 / 慚負樓前游夏行
초나라 인재 진량은 전국 시대 문명이 미개한 초 나라 태생이었으나, 주공(周公)·중니(仲尼)의 도를 좋아하여 북으로 중국(中國)에 가서 유학하였는데, 중국의 선비들이 그보다 나은 이가 없을 정도로 대유(大儒)가 되었다. 《孟子 滕文公上》
‘연어는……땅을 나누었고’는 《중용(中庸)》 제12장(第十二章)에 “《시경》에 이르기를 ‘솔개는 날아서 하늘에 이르고 물고기는 못에서 뛴다’ 하였으니, 이는 도의 묘용이 천지에 밝게 드러난 것을 말한 것이다.[詩云鳶飛戾天 魚躍于淵 言其上下察也]” 한 데서 온 말이다.
‘유하의 배항’은 나이 어린 생도(生徒)들을 이름. 유하는 공자의 제자 가운데 특히 문학(文學)이 뛰어났던 자유(子游)와 자하(子夏)를 합칭한 말인데, 자유는 공자보다 45세 아래였고, 자하는 공자보다 44세 아래였다.
전주에서 삼월 삼일에 향음례와 향사례를 거행하다[全州三月三日行鄕飮鄕射禮]
향음례의 남긴 법이 하루에 새로워지니 / 鄕飮遺謨一日新
성대한 조정의 풍화가 무리에 뛰어나네 / 盛朝風化冠群倫
황화대 아래서 한창 수작을 하노라니 / 黃花臺下方酬酢
오만 눈들이 함께 주인과 빈객을 보누나 / 萬目同看主與賓
오작의 예를 끝낸 다음 다시 서로 경계하고 / 禮成五酌更相規
사사가 머뭇거리며 말이 있어야 하는데 / 司射逡巡合有辭
일거에 아울러 행한 게 참람한 듯하긴 하나 / 一擧竝行雖似僭
향인들이 어렴풋이나마 옛 의식을 아는구려 / 鄕人髣髴識遺儀
애써 부르지 않아도 사수들이 모이었는데 / 不勞徵召射夫同
읍양의 절차가 아직도 삼대풍이 남았구나 / 揖讓猶存三代風
채번곡 연주 끝내고 깍지 팔찌를 거두니 / 疊盡采蘩收決拾
충만한 기분이 행단 안에 있는 것 같도다 / 充然如在杏壇中
정히 따스한 봄 삼월이라 삼짇날에 / 正是靑春三月三
산꼭대기 화살받이에 북소리 은은하구나 / 岡頭射垜鼓韽韽
유상곡수 놀이는 전혀 쓸데없는 일이라 / 流觴曲水渾閑事
양치한 나머지에 즐거움이 그지없구려 / 揚觶之餘樂且湛
사사는 향사례(鄕射禮)에서 주인(主人)을 보좌하는 사람인데, 그는 특히 삼 조(三組)로 된 6인의 사수(射手)들이 활쏘기에 앞서 그 시범을 보인다고 한다. 《儀禮 鄕射禮》
양치는 치는 술잔이다. 향사례를 마친 뒤에 주인이 상자(相者)를 시켜 빈(賓)과 대부(大夫)에게 술잔을 들어 올리게 하는 의식이다.
완산에서 부림군식에게 받들어 주다[完山奉贈富林君湜]
계양군(桂陽君)의 아들로 시를 썩 잘하는데, 자기 아들의 혼인에 관한 일로 역마를 타고 고부(古阜)로 간다.
왕손이 남국에서 역마를 타고 나가니 / 王孫南國儼驂騑
푸른 죽순 누런 매실이 비단옷에 비치누나 / 綠筍黃梅映錦衣
패부의 강산은 장한 기상을 제공하고 / 沛府江山供氣岸
영주의 초목은 빛난 광채를 입었도다 / 瀛洲草木被光輝
곡중의 이별의 슬픔은 금비녀를 적시고 / 曲中離思霑金鈿
취한 속의 시 생각은 거문고에 옮겨지네 / 醉裏詩情轉玉徽
부끄러워라 일찍이 잔술의 풍류도 못 나눴다가 / 自愧曾無杯酒雅
오늘 용문에 오르니 그리운 마음 그지없구려 / 龍門今日重依依
패부 : 한 고조(漢高祖)의 발상지가 패현(沛縣)이었으므로, 전하여 제왕(帝王)의 고향을 이르는데, 여기서는 곧 이 태조(李太祖)의 본관인 완산(完山)을 가리킨다.
영주 : 고부(古阜)의 고호임.
완산 도회의 제생에게 답하다[答完山都會諸生]
인재와 지망이 서로 동떨어지지 않는다고 / 人材地望不相懸
함장이 조용하게 뜻을 이미 전하였네 / 函丈從容意已傳
만화루 안에서는 성인의 도를 연구하고 / 萬化樓中硏聖道
황화대 아래는 손의 자리가 널찍하도다 / 皇華臺下敞賓筵
붕정은 통해야 하니 춤을 추게 해야 하지만 / 朋情要暢宜敎舞
강설은 술을 마셔야지 어찌 침을 허비하랴 / 講舌須澆肯費涎
예로부터 호남은 벽사로 일컬어졌으니 / 自古湖南稱甓社
구슬을 찾으려 지금 깊은 못을 말리려 하네 / 搜珠今擬渴深淵
벽사 : 강소성(江蘇省)에 있는 벽사호(甓社湖)를 이름. 벽사호 속에는 크기가 주먹 만한 구슬이 있어 빛이 10여 리를 비춘다는 전설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 구슬을 인재(人材)에 비유한 것이다.
진남루에서 이 절도사에게 화답하다[鎭南樓和李節度使]
동방이 천 년 만에 성군을 만났으니 / 鰈域千齡遇聖君
육균으로 어찌 작은 공훈 책록할 수 있으랴 / 六鈞焉得策微勳
진남루 위에서 꽃구경하는 절도사는 / 鎭南樓上看花使
일찍이 적군을 전멸시킨 곽 관군이라오 / 曾是鏖兵霍冠軍
육균 : 1균(鈞)은 30근(斤)에 해당하니, 즉 180근 무게의 활을 말한 것으로, 춘추 시대 노(魯) 나라 안고(顔高)의 활이 무게가 6균이었다고 한다.
곽 관군 : 관군은 곧 대장군(大將軍)과 같은 뜻으로, 한 무제(漢武帝) 때의 명장(名將) 곽거병(霍去病)을 가리킨다.
전주 김부윤견수에 대한 만사[全州金府尹堅壽挽詞]
김공(金公)은 기묘년의 무과(武科) 제삼인(第三人)으로 나와는 동년(同年)이다. 지난해 11월에 부윤(府尹)으로 전주(全州)에 부임했는데, 전주가 바로 감사(監司)의 본영(本營)이기 때문에 나와는 더욱 자주 만나서 담화를 했었다. 나는 임기가 차서 바야흐로 이 고을에 머물러 교체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우리는 지난 단오일(端午日)에 함께 매월정(梅月亭)에 올라가서 그네 뛰는 놀이를 구경했는데, 그 이튿날 부윤이 갑자기 병가(病暇)를 청하더니, 그로부터 7일이 지난 11일 새벽 닭이 울 무렵에 별세하였다. 그래서 마침내 이달 24일에 발인(發引)하여 장단(長湍)으로 갔다. 아, 어쩌면 이렇게도 갑작스럽단 말인가. 슬프도다.
대정에서 창방할 땐 기백이 무지개 같았는데 / 大庭臚句氣與虹
두 방의 뛰어난 재주가 누가 공만 했으랴 / 兩牓豪才孰似公
서울에서의 종유는 늘 적어서 한이었는데 / 九陌過從常恨少
올 봄에는 담소를 매양 같이하였네 / 一春笑語每回同
대방의 관현악 소리엔 기쁨이 흡족했는데 / 帶方絲竹歡曾洽
패관의 그네뛰기엔 꿈이 문득 비어 버렸네 / 沛館鞦韆夢忽空
결별의 술잔을 들고서 마시지도 못하고 / 爲擧別觴觴不釂
끝없이 흐르는 눈물을 남풍에 뿌리노라 / 無端涕淚灑南風
용안에서 비바람에 막히어 벽상의 운을 사용하여 기록하다[龍安阻風雨用壁上韻記之]
모악산 바람이 대단히 노했으니 / 母山風怒甚
진포에 비가 막 개인 때로다 / 鎭浦雨晴初
까치는 성 머리 나무에서 일어나고 / 鵲起城頭樹
악어는 바다 속의 고기를 쫓누나 / 鼉奔海底魚
뭉게구름은 강로 밖에 떠 있고 / 陣雲江路外
도성 터는 옛 나라의 나머지로다 / 基甸舊邦餘
가거나 머묾에 참으로 걱정 없으니 / 去住眞無悶
나의 행차도 또한 자약하구나 / 吾行亦自如
맑은 새벽에 휘장 걷고 앉았노니 / 褰帷坐淸曉
지스락에 빗소리 깊기도 하여라 / 屋霤雨聲深
조수는 아득한 포구에서 나오고 / 漠漠潮生浦
새는 어두운 숲을 지나가누나 / 冥冥鳥度林
비록 돌아갈 계획은 품었으나 / 雖懷班馬計
해골로 불 땔 마음 가질까 염려로다 / 恐有析骸心
구름이 엷어졌는가를 자주 물으며 / 數問雲漓否
인하여 안석에 기대 시를 읊노라 / 因成隱几吟
이 고을에는 땔나무 할 곳이 없어 다만 볏짚을 때서 밥을 지어 먹는데, 비가 3일을 연해서 내리자 볏짚 또한 다 되어 갔다. 그런데 내가 하루를 더 머무르려고 하니, 현인(縣人)의 얼굴에 근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위령을 지나다[過葦嶺]
평생에 자안(이숭인)의 시를 즐겨 외었는데 / 平生愛誦子安詩
천 겹의 위령에 뒤늦게야 당도하였네 / 葦嶺千重到校遲
오늘 입암산 아래서 생각해 보니 / 今日笠巖山下憶
이 적선은 일찍이 수차령을 기이타 했네 / 謫仙曾道水車奇
도은(陶隱)의 시에 “웅진의 물은 일말이 푸르고 위령은 일천 겹이 푸르구나[熊津靑一抹 葦嶺翠千重]” 하였고, 또 이백(李白)의 시에는 “추포의 일천 겹의 봉우리 가운데 수차령이 가장 기이하도다[秋浦千重嶺 水車嶺最奇]” 했다.
한식일에 고부의 민락정에서 이 직강과 즐겁게 마시면서 벽상의 운에 차하다[寒食日古阜民樂亭與李直講歡飮次壁上韻]
석양의 정자에 가취 소리 퍼지니 / 歌吹華亭晩
나의 행차는 참으로 자유롭구나 / 吾行儘自由
어찌 한식의 눈물을 흘리리오 / 寧垂寒食淚
취향후나 되어 볼까 하노라 / 擬作醉鄕侯
먼 불빛은 소금 굽는 집임을 알겠고 / 遠火知鹽戶
겹겹의 구름은 신기루를 연상케 하네 / 層雲想蜃樓
청신한 기쁨 오늘만함이 없었으니 / 淸歡無此日
의당 봄놀이의 으뜸이라 하겠네 / 當冠一春遊
취향후는 술 좋아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 당(唐) 나라 때 왕적(王績)이 취향기(醉鄕記)를 지어 유령(劉伶)의 주덕송(酒德頌)을 이었는데, 당인(唐人)의 시에 “만일 유령을 술의 황제로 삼는다면 또한 의당 나를 취향후로 봉해야 하리[若使劉伶爲酒帝 亦須封我醉鄕侯]” 라 했다.
부안에서 상사 이계맹의 시 삼 수에 화답하다[扶安和李上舍繼孟三首]
이때 명(明) 나라의 한림학사(翰林學士) 동월(董越)과 급사중(給事中) 왕창(王敞)이 새 황제의 조서를 받들고 우리 나라에 왔는데, 조정의 의논이 사신(使臣)이 반드시 문묘(文廟)를 배알하고 유생들에게 저술(著述)을 시험보여야 한다고 하여, 마침내 중외(中外)의 생원(生員)·진사(進士)들을 대대적으로 불러 성균관(成均館)에 모이도록 하였다.
학덕 높은 한림의 조서 전하는 의복이요 / 嶷嶷翰林傳詔服
수많은 성균관 유생의 진현관이로다 / 兟兟胄監進賢冠
마의 입고 북으로 가서 의당 나라를 빛내야지 / 麻衣北去須華國
지금은 주머니도 정히 썰렁하지 않으리라 / 囊槖如今正不寒
상사(上舍)가 막 장가들었다.
운몽택 삼키는 걸 어찌 셀 것이나 있으랴 / 胸呑雲夢何須數
일찍이 변산의 제일봉을 올랐었다오 / 曾上邊山第一峯
뱃속엔 오경이 있고 시는 상자에 가득하니 / 腹有五經詩滿篋
화려한 귀족 자제들이 모두 조용해지리 / 綺羅叢裏儘從容
천애의 영주 북쪽엔 관현악 소리 울리고 / 天涯絲管瀛洲北
운연 속의 나그네는 한식을 지낸 뒤로다 / 客裏雲煙熟食餘
스스로 지체 말고 화급히 길을 떠나려무나 / 火急着鞭毋自泥
그대 재주는 끝내 천거를 의지하지 않으리 / 君才終不仗吹噓
운몽택 삼키는 걸 : 가슴속이 매우 광대함을 이름. 사마상여(司馬相如)의 상림부(上林賦)에 “초(楚) 나라의 운몽택은 사방이 9백 리나 되는데, 운몽택 같은 것 8, 9개를 삼켜도 가슴속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직강에 제수되어 서울로 가는 이 도사를 보내다[送李都事除直講還京]
부절 갖고 호남을 안찰했노니 / 建節按湖南
민풍을 어찌 말할 수 있으랴 / 民風烏可說
염량 세태는 때로 자주 변하고 / 炎涼時屢變
세속 일은 머리털처럼 많았는데 / 世故多如髮
시기에 임해선 늘 제지를 받았고 / 臨機動掣肘
사물 살피는 데엔 헷갈리기도 하였네 / 亦或迷察物
그런데 이후가 막빈으로 있었기에 / 李侯在賓幕
나는 읊조리며 결재나 했을 뿐이네 / 鄙夫但嘯諾
이후는 동해의 빼어난 재주로서 / 李侯東海秀
가정 교훈으로 유술을 이어받아 / 庭訓襲儒術
육경을 가슴속에 가득 담고 / 六籍載其腹
여사로는 시율에도 경지가 깊었네 / 餘事深於律
출입할 제 서로 친근히 지내면서 / 出入與比附
중요한 일을 능히 부결하였는데 / 肯綮能剖決
매양 옥사를 심리할 때에는 / 每當讞獄時
항상 나의 무릎을 꿇게 하였네 / 常敎吾膝屈
호남은 지역이 비록 작으나 / 湖南地雖小
산과 바다가 몹시 멀리 막히어서 / 山海苦遼隔
풍토는 혹 서로 고르지 못하고 / 風土或不齊
도리는 빙빙 돌아 멀고도 곧았네 / 道里迂且直
빈료가 마음에 맞는 이가 아니면 / 賓僚非會心
누구와 더불어 상의를 하였으랴 / 誰與共咨度
이후가 나를 버리고 떠나가니 / 李侯舍我去
작별을 임하여 회포가 사납구려 / 臨岐懷抱惡
성조에서 유술을 중히 여기어 / 聖朝重儒術
연어의 조화를 밝게 천명했으니 / 光闡鳶魚化
이후가 함장 자리에 있으면 / 李侯在函丈
어찌 회초리를 번거롭게 치리오 / 何曾煩楚榎
행단에 해가 한창 길어지거든 / 杏壇日方永
또한 술 마실 겨를도 있으려니와 / 銜杯亦有暇
여기에서 사헌부로 승진이 되면 / 臺府自此升
세상 맛이 참으로 점입가경이리라 / 世味眞啖蔗
다순 바람이 날로 성하게 불어오니 / 溫風日旎旎
화초들이 어이 그리 무성한고 / 花卉何丰茸
천원은 온통 은덕의 빛이요 / 川原盡德色
화려한 꽃은 겹치고 또 겹치었네 / 綺繡重復重
좋은 때를 저버릴 수 없거니와 / 良辰不可負
이별은 모름지기 조용히 해야 하니 / 離別須從容
의당 하루의 즐거운 놀이 꾀하여 / 宜圖一日歡
함께 답답한 가슴을 씻어나 보세 / 共洗輪囷胸
연어의 조화 : 천지 자연의 조화, 즉 도(道)를 가리킨 말로, 자세한 것은 앞의 주석에 나타나 있다.
고부군에서 처음으로 꾀꼬리 울음소리를 듣다[古阜郡初聞栗留]
영주로 드는 길에서 취한 꿈이 깨어라 / 路入瀛洲醉夢醒
나무 끝 꾀꼬리 소리가 너무도 정녕스럽네 / 樹頭鶯語太丁寧
소녀가 어찌 이 사신의 뜻을 알리오 / 小娃豈識皇華意
열흘 동안 이미 실컷 들었다 웃으며 말하네 / 笑道旬時已厭聽
영주 : 고부(古阜)의 고호임.
흥덕의 서관에서 차운하다[興德西館次韻]
백 길의 높은 성에 천 길의 봉우리라 / 百雉危城千仞峯
올라 보니 몸이 서늘한 바람을 탄 듯한데 / 登臨身似馭冷風
노는 사람 웃음소리는 초루 밖에서 들려 오고 / 遊人笑語華譙外
먼 포구 돛단배는 저녁 노을 속에 떠 있네 / 極浦帆檣返照中
한 길은 동서로 어찌 그리 아득히 먼고 / 一道東西何窵遠
하늘과 땅의 높낮음은 태초의 그대로구나 / 二儀高下自鴻濛
오사모 반쯤 벗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 烏紗半岸沈吟久
묻노니 황혼의 북소리가 몇 번이나 울렸는고 / 且問黃昏鼓幾通
민락정에 오르다[登民樂亭]
민락정 안에 백성의 일이 적은지라 / 民樂亭中民事少
우연히 여흥을 타서 가득한 술잔 마시노니 / 偶乘餘興引深巵
두강은 아직도 바다 어귀에 있는데 / 頭綱猶在海亹處
나그네는 장차 서울로 돌아갈 때로다 / 客子將歸京邑時
언덕은 겹겹이라 참으로 그림보다 아름답고 / 墩塢重重眞勝畫
구름 덮인 산은 우뚝하니 시가 없을 수 있으랴 / 雲山矗矗可無詩
난간에 기대 황학 타고 신선이 되어 가고 싶은데 / 靠欄擬欲騎黃鶴
누가 회선의 철적을 가져 불어 줄런고 / 誰捻回仙鐵笛吹
회선 : 당(唐) 나라 때의 선인(仙人) 여동빈(呂洞賓)의 별칭이다.
고부의 민락정에서 조선을 바라보다[古阜民樂亭望漕船]
3월 29일에 법성포(法聖浦)의 조선(漕船) 60여 척이 부안(扶安)의 변산(邊山) 아래 당도하여 바람을 만났는데, 작당(鵲堂)에 정박한 34척은 모두 온전하고, 모항양(茅項洋) 밖에 정박한 배들은 모두 패선되어 익사자(溺死者)가 3백여 명이나 되었다.
천 척의 배가 흰쌀을 운반하는데 / 千艘運白粲
바닷길은 어찌 그리도 아득한고 / 海道何悠悠
도서가 천백 겹으로 둘러 있어 / 島嶼千百重
해마다 파도의 우환이 있었네 / 歲有風濤憂
지난해엔 제법 평년작을 이루어 / 前年頗中熟
국고가 다행히 조금 넉넉하였네 / 國廩幸少優
수많은 배들이 강장을 출발하여 / 舳艫發江藏
저녁에 변산 모퉁이에 닿았는데 / 夕止邊山陬
뱃사람들의 마음이 각각 달라 / 舟人各有心
흩어서 정박하여 수합할 수 없었네 / 散泊不能收
그래서 큰 파도가 밤에 마구 쳐 대어 / 驚波夜盪激
반은 침몰하고 반은 표류되었으니 / 半溺半漂浮
어떻게 풍백을 죽일 수 있으랴 / 焉能戮風伯
양후를 죽일 계책 또한 없어라 / 無計戕陽侯
백성의 고혈은 우선 그만두고라도 / 民膏且勿論
죽은 자는 누가 은인이고 원수인고 / 死者誰恩讎
통곡 소리가 물가에 진동하건만 / 哭聲殷水濱
아득한 바다 어디에서 찾을꼬 / 茫茫何處求
멀리 작당의 후미진 곳 바라보니 / 遙望鵲堂澳
큰 배 만 척도 감춰 둘 만했는데 / 可藏萬海鰌
시기를 당하여 호령을 잘못했으니 / 臨機失號令
이렇게 된 게 진정 까닭이 있도다 / 致此良有由
풍백 : 풍신(風神)을 말한다.
양후 : 해신(海神), 또는 파도신(波濤神)을 말한다.
쌀을 건져내는 데 대하여 탄식하다[漉米嘆]
조선이 파패되자, 즉시 흥덕 현감(興德縣監)·부안 현감(扶安縣監)·금모포 권관(黔毛浦權管)을 명하여 팔 읍(八邑)의 군사들을 독책해서 바다에 침몰된 쌀을 건져내게 한 결과 3천 7백여 석을 건져냈는데, 5일이 지난 뒤에 건진 쌀은 부패하여 악취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다.
큰 바다 가운데서 쌀을 건지려니 / 漉米滄海中
어둔 바다에 바람도 쉬지를 않네 / 海暗風不息
사람들은 철룡조를 가지고서 / 人持鐵龍爪
언덕에 메뚜기떼처럼 모이었네 / 崖岸螽蝗集
동서로 부서진 판자를 바라보니 / 東西望壞版
그 밑에 잔뜩 쌓인 것이 있는데 / 其下有堆積
조수가 산더미처럼 말아 오면은 / 潮頭卷連山
황급히 도망쳐 물러나 서 있다가 / 折趾仍却立
조수가 물러갈 때에 함께 끌어내니 / 乘退共拽出
한 가마에 열 사람이 움직이도다 / 一斛動十力
언덕 근처는 혹 기대할 만도 하나 / 近岸或可冀
바다 한가운데야 누가 추적을 할꼬 / 大洋誰蹤跡
그 숫자는 모두 일만 팔천 석인데 / 厥數萬八千
겨우 오분의 일만을 건져내었고 / 五分纔一獲
십 일 간이나 물에서 못 꺼낸 것은 / 淹旬不出水
냄새와 맛이 모두 대단히 나빠져서 / 臭味俱穢惡
백 보 거리도 접근할 수가 없으니 / 百步不可近
큰 돼지도 장차 먹지 않으리라 / 大豕亦將殼
강제로 저 농민에게 분배하는 건 / 抑配彼農民
아 국가의 법칙이 아니니 / 嗚呼非令式
짐짓 그곳에 그대로 남겨 두어서 / 不如姑置之
원타의 먹이로 주는 것만 못하겠네 / 留與黿鼉食
철룡조 : 쇠로 만든 흙을 파는 도구이다.
순창의 관정루에서 절도사 이계동과 함께 판상의 운에 차하다[淳昌觀政樓同李節度使季仝次板上韻]
관찰사 직무 일 년여에 헛된 이름만 훔치고 / 甘棠朞月竊虛名
관정루 안에서 술을 불러 마시노라니 / 觀政樓中喚麴生
정히 옷깃 헤치고 열뇌를 몰아내야지 / 正要披襟驅熱惱
얼굴 씻으러 맑은 물 떠올 것 없어라 / 不須灑面挹深淸
한 지방 나그네들은 교심에서 떠들어대고 / 一方行旅橋心鬧
천실의 밥짓는 연기는 숲 끝에 펀펀하구나 / 千室炊煙樹頂平
예로부터 순창은 순박하다 호칭했으니 / 從古淳州號淳朴
부서를 걷어 치우고 꾀꼬리 소리나 듣자꾸나 / 簿書揮罷聽鶯聲
국이의 운을 사용하여 임피의 경군 상에게 주다[用國耳韻贈臨陂慶君祥]
무재는 낭성의 명문 후손인데 / 茂宰琅城胄
김장이 고삐 나란히 하여 노니네 / 金張竝轡遊
왕의 조서는 하늘 북쪽 끝이요 / 絲綸天北極
거문고와 학은 바다 서쪽 끝이로다 / 琴鶴海西頭
시골에선 다투어 바지를 노래하고 / 委巷爭歌袴
백성들은 소를 띠지 않았구려 / 齊民不帶牛
민풍 관찰은 나의 일이 아니니 / 觀風非我事
정히 사군을 위하여 남겨 주노라 / 端爲使君留
이 때 나는 이미 교체되었다.
무재는……후손인데 : 무재는 지방관을 높여 일컫는 말이고, 낭성(琅城)은 청주(淸州)의 고호이니, 즉 임피 현령(臨陂縣令) 경상(慶祥)이 청주 경씨임을 뜻한 말이다.
김장 : 한(漢) 나라 때 7대(代) 동안 임금을 가까이 모시어 함께 영화를 누렸던 김일제(金日磾)와 장안세(張安世)의 두 가문을 가리킨다.
거문고와 학 : 이 두 가지는 모두 고상한 선비가 좋아하는 것이므로 한 말이다.
시골에선 다투어 바지를 노래하고 : 지방관의 선정(善政)을 비유한 말. 후한(後漢) 때 염범(廉范: 자는 숙도〈叔度〉임)이 촉군태수(蜀郡太守)가 되어 선정을 베풀자, 백성들이 좋아하여 노래하기를 “염숙도가 어찌 그리 늦게 왔는고 …… 평생에 속옷도 없었는데 지금은 바지가 다섯 벌이라네[廉叔度 來何暮 …… 平生無襦 今五袴]” 한 데서 온 말이다.
백성들은 소를 띠지 않았구려 : 백성들이 농사에 힘씀을 비유한 말. 한(漢) 나라 때 공수(龔遂)가 발해태수(渤海太守)로 있으면서 백성들의 허리에 띠고 다니는 도검(刀劍)을 팔아 소를 사게 하고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소와 송아지를 허리에 띠고 다니는고. 봄여름에는 당연히 논밭으로 나가야 한다.” 한 데서 온 말이다.
청원루에 제하다[題淸遠樓]부안(扶安)이다.
맑고 깨끗함이 참으로 팔영루와 같으니 / 瀟灑眞同八詠樓
화려한 누각 순식간에 이룬 성후를 하례하네 / 咄嗟華構賀成侯
외딴 마을 조수는 시 읊는 가에 응하고 / 孤村潮汐吟邊應
먼 산의 저녁 남기는 바라보는 속에 걷히도다 / 遠岫雲嵐望裏收
공무를 벗어나서 마음놓고 술잔 잡으니 / 簿領解圍聊把酒
무더운 기운 무력해져 문득 가을에 놀라네 / 炎敲無力忽驚秋
돌아오란 명 받은 병객이 맑은 흥에 취하여 / 賜環病客乘淸興
바닷가 장기 속에 머무름도 깨닫지 못하네 / 不覺淹留瘴海頭
성후의 이름은 수겸(守謙)인데, 고향이 나와 똑같은 밀양부(密陽府)이다. 이 누(樓) 및 개풍(凱風)·영휘(迎暉)·망양(望洋) 등 세 문루(門樓)는 모두 성후가 세운 것인데, 절도사 이 상국 계동(李相國季仝)이 이 누를 청원(淸遠)이라 명명하였다.
개풍루에 오르다[登凱風樓]부안이다.
개풍루 위를 마음대로 올라와 보니 / 凱風樓上恣登臨
발해의 동쪽 바닷가는 땅이 더욱 깊숙하네 / 渤澥東堧地更深
낚싯대 두 길이쯤 솟은 해는 은은하게 붉고 / 旭日兩竿紅隱隱
일천 이랑의 맑은 못은 침침하게 푸르구나 / 晴池千頃翠沈沈
거민들은 고기잡이의 이익을 다투어 찾는데 / 居人競逐魚梁利
게으른 나그네는 대궐에만 마음이 달려 있네 / 倦客長懸象闕心
관찰사 재직 이 년에 무슨 일을 하였는고 / 棠茇二年何事業
난간에 기대어 애오라지 속된 마음 씻노라 / 憑欄聊且灑塵襟
부안현에서 자준 영공이 노자로 준 시운에 화답하다[扶安縣和子俊令公贐行韻]
산서의 호협한 기운은 유병을 압도하나니 / 山西豪氣壓幽幷
그 누가 명공처럼 유독 잘 울리리오 / 誰似明公獨善鳴
예를 말하고 시를 힘씀은 참으로 자득한 건데 / 說禮敦詩眞自得
가벼운 옷 느슨한 띠는 아무 경영함이 없구려 / 輕裘緩帶却無營
후산에겐 일찍이 위엄과 덕으로 교화했으니 / 猴姍早已移威德
기린각엔 끝내 의당 성명이 올라가리라 / 麟閣終當揖姓名
부절 갖고 남쪽에 올 땐 조서를 함께 받았는데 / 南服分符同尺一
먼저 돌아가는 오늘에 내 심정이 어떻겠는가 / 先歸今日若爲情
인간 세상엔 헤어지면 만나기 어렵기에 / 人世睽離少合幷
부령에서 애오라지 불평의 울음을 짓노라 / 扶寧聊作不平鳴
끊임없는 담소에 밤은 점점 깊어졌고 / 笑談袞袞長侵夜
더디더디 가는 깃발은 멀리 감영을 가리키네 / 旌旆遲遲遠指營
취하고픈 건 하삭의 술과 같은 것이 아니요 / 欲醉非同河朔酒
서로 친함은 다만 두남의 명성때문일세 / 相親只爲斗南名
개풍문 밖의 서로 헤어지는 길에는 / 凱風門外分岐路
찬 비와 검은 구름이 무한한 정이로다 / 凍雨陰雲無限情
유병 : 옛날 연(燕)·조(趙)의 땅인 유주(幽州)·병주(幷州) 지역을 이르는데, 그곳 풍속은 기절(氣節)을 숭상하고 유협(游俠)을 일삼았으므로, 전하여 시풍(詩風)의 호협(豪俠)함을 비유한다.
잘 울리리오 : 시문(詩文) 같은 것으로 명성을 세상에 드날림을 비유한 말이다.
후산 : 한(漢) 나라 때 흉노(匈奴) 호한야선우(呼韓邪單于)의 이름인 계후산(稽猴姍)의 약칭이다. 여기 원문의 산(姍) 자는 잘못된 글자이다.
하삭의 술 : 하삭은 곧 하북(河北)인데, 후한(後漢) 때 유송(劉松)이 그곳에서 원소(袁紹)의 자제들과 함께 삼복(三伏) 때마다 주야로 술을 많이 마시어 일시적인 피서(避暑)를 했던 데서 온 말이다.
두남의 명성 : 두남은 북두성(北斗星) 남쪽이란 뜻이니, 두남의 명성이란 곧 천하제일인(天下第一人)임을 의미한다.
도사 윤파를 작별하다[別尹都事坡]
호남에서 수월 동안 함께 일을 상의해 보니 / 湖南數月共咨詢
의당 영평엔 대대로 사람이 있음을 믿겠네 / 須信鈴平世有人
막부에 들어 담소할 땐 참으로 온화하고 / 入幕笑談眞醞籍
연회를 당해선 회포가 다시 청순하였지 / 當筵懷抱更淸醇
문서 끝엔 서아가 젖은 걸매양 보았더니 / 每看牘尾棲鴉濕
반심엔 수해가 새로울 걸미리 생각하네 / 預想班心繡獬新
오늘 여량에서 눈물을 흘리며 작별하노니 / 今日礪良垂淚別
명년에는 서울의 봄을 저버리지 마세나 / 明年莫負九街春
영평 : 파평(坡平)의 고호로서, 즉 파평 윤씨인 윤파(尹坡)의 가문(家門)을 가리킨 말이다.
서아가 젖은 걸 : 까마귀는 검은 빛을 뜻하므로, 즉 문서를 기록할 적에 먹물이 종이에 젖는 것을 이른 말이다.
반심엔 수해가 새로울 걸 : 법관(法官)에 제수되었음을 뜻함. 반심은 옛날 어사대(御史臺)의 아전들이 어사(御史)가 서는 곳을 지칭한 말이고, 수해(繡獬)는 해치(獬豸)를 수놓은 법관이 쓰는 관(冠)을 말한다.
여량 : 여산(礪山)의 고호(ⓒ한국고전번역원 ┃ 임정기 (역) ┃ 1996)
'전북스토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진안의 담배 (18) | 2022.06.17 |
|---|---|
| 좁은목, 초록바위, 숲정이 등 전주 3대 바람통 (0) | 2022.06.16 |
| 익산 미륵사 목탑을 석탑보다 먼저 조성, 배수 위해 깬 돌과 흙으로 기초 다지다. (0) | 2022.06.15 |
| 전주는 교육의 도시 '희현당' 학술 대회, 15일 신흥고에서 개최 (0) | 2022.06.14 |
| 화승 봉화(奉華) 등이 그린 선운사 도솔암 극락보전 내 봉안된 ‘현황도(現王圖)’와 ‘독성도(獨聖圖)’ , 전북 유형문화재로 지정예고 (0) | 2022.06.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