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이 학술총서 '맷돌의 세상'과 '인류학자 오스굿의 강화도 연구, 1947년 자전적 회고록을 중심으로'를 발간했다. 박물관은 이번에 발간한 두 권 학술총서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도록 기획했다. '맷돌의 세상'은 맷돌 기원과 역사, 세계 각 지역에서의 쓰임새를 종합적으로 다룬 연구서다. 지은이 김광언 인하대 명예교수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유럽 등 방대한 맷돌 자료를 수집했다. 맷돌 어원과 용례, 구조와 기능을 분석하고, 맷돌을 만드는 장인들 이야기와 맷돌 관련 속담, 놀이, 시(詩)도 담아냈다. ‘맷돌로 만나는 전북의 생활 문화’를 소개한다. 편집자
■맷돌은 음양의 조화 상징
△ 판소리 ‘춘향가’에서 이몽룡(李夢⿓)이 성춘향(成春香)에게 이르는 대목
몽룡은 춘향의 손을 더 꽉 쥐었다. 춘향은 뭔가에 홀린 듯했지만 제 스스로는 몸도 가누지 못할 만큼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만 같아 손을 몽룡에게 맡긴 채 엉거주춤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 “춘향아, 오늘 우리가 드디어 만나 상견례(相⾒禮)를 하였으니 내일 또 만나 맷돌처럼 아주 한 짝이 되자꾸나”
‘상견례’는 혼인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 동등한 예(禮)를 지켜 공식(公式)으로 마주하는 인사를 가리킨다. 이를 맞절이라도고 한다. ‘내일 또 만나 맷돌처럼 아주 한 짝이 되자꾸나’에서 강한 다짐이 읽혀진다.
△ 앞 노래 ‘춘향가’의 한대목
나는 죽어 밑짝이 되어
이팔청춘 홍안 미색들이
섬섬옥수 맷대를 잡고
슬슬 돌리면
천원지방(天圓地方) 격으로
휘휘 돌아가거든
나인 줄 알려무나
‘독매’는 돌맷돌의 전라도 사투리이고, ‘위짝’은 암매, ‘밑짝’은 수매, ‘맷대’는 맷손을 가리킨다. 그리고 ‘천원지방’은 둥근 하늘인 양(陽)과 네모의 땅(陰)이 음양의 조화를 이루며 돌아간다는 말이다.
△고은(高銀, 1933~ )의 시(‘낮거리’)
대낮 환할 때
눈 뜨기도 하고
눈감기도 하며 찧어대야지
맷돌 갈아야지(‘만인보(萬⼈譜)’ 7)
‘낮거리’는 낮에 하는 성교이다.
△ 맷방석을 갓에 견준다
(1) 이병기(李秉岐, 1891~1968)의 글이다(부분)
이러한 것이 모두 고대~고려, 이조(李朝)~그 시대 그때의 인정, 풍속, 생활상태를 배경으로 한 것인 만큼, 현대 사람인 우리로서는 사상, 감정에 맞지 않을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학문이라면 공자(孔孟) 정도만 알고, 문자라면 한문만 알고, 맷방석 만한 갓을 쓰고 간질대 같은 장죽(⻑⽵)을 입에 물고 애화당기(愛花當妓)요 완보당거(緩步當車)니 하는 늘어진 수작이나 하든(던) 때가 지금과는 여간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때요, 지금은 지금이다(‘삼천리[三千⾥]’ 제7권 제11호, 1935년 12월 1일 ‘시조강좌(時調講座)’’
‘간질대’는 대나무로 된 긴 장대를 가리키는 간짓대의 사투리이다. ‘애화당기’는 꽃을 사랑하는 것이 기생을 대하는 것보다 좋고, ‘완보당거’는 천천히 걷는 것이 수레를 탄 것보다 낫다는 뜻이다.
△ 맷방석을 보름달에 견준다
서정주(徐廷柱, 1915~2000)의 시(‘山골 속 햇볕’)이다.(부분)
그래서 마지막 우리 앞에 깔리일 것은
山골 속 깔아논 멧방석만한
멧방석만한 山골 속 햇볕
멧방석만한 山골 속 햇볕(‘미당 서정주 시전집’)
‘멧방석’은 ‘맷방석’의 잘못이다.
△ 실상사와 선운사
실상사
암매가 제짝이 아닌데다가 맷손도 두 줄의 청사로 엉성하게 얽어놓았을 뿐이다. 옆구리의 구멍은 본디 맷손을 이곳에 박았던 것을 알려준다.
위에서 본 암매이다. 입 주위를 너르게 그리고 우묵하게 다듬었다.
동강 나무 13개를 성기게 엮어서 꾸민 받침이다. 맷돌에 갈린 콩물은 바로 아래의 그릇으로
떨어진다. 길이를 끝으로 가면서 줄인 형태가 거북의 등짝을 연상시킨다.
또 다른 맷돌의 수매와 받침이다. 큰 돌을 적당히 다듬은 다음, 입 주위를 둥글게 파서 수매의 형상을 갖추었다. 갈린 곡물은 왼쪽에 터놓은 쪽으로 흘러내린다.
이(齒)를 세운 자취는 보이지 않는다. 모두 4개의 맷돌이 등장한다.
선운사
짝을 잃은 암매이다. 수매에 꼭 들어맞도록 중쇠 구멍 주위를 우묵하게 다듬었다.
크기는 지름 55㎝에 높이 17㎝이며, 중쇠 구멍은 지름 5㎝에 깊이 5.5㎝이다. 혀는 자취만 남았으며, 옆구리의 맷손 구멍을 길이로 팠다.
또 하나는 앞 절에 딸린 도솔암(兜率庵)의 것이다. 암매 위의 마련한 두툼한 전과, 맷손 앞의 눈망울을 연상시키는 무늬도 눈에 띈다. 또 표면을 왼쪽 끝의 네모꼴 입쪽으로 비스듬히 다듬어서 곡물이 절로 흘러내리게 한 것도 남다르다. 크기는 암매 지름 22㎝에 높이 22㎝이며(암⋅수매), 전의 너비는 5㎝이다. 긴 네모꼴의 맷손 구멍은 가로 3.4㎝에, 세로 2㎝이다.
옆 모양의 것도 있다. 맷손을 붙박기 위해 암매 옆구리 위아래에 철사를 둘러놓았다.
△ 전북 민가의 맷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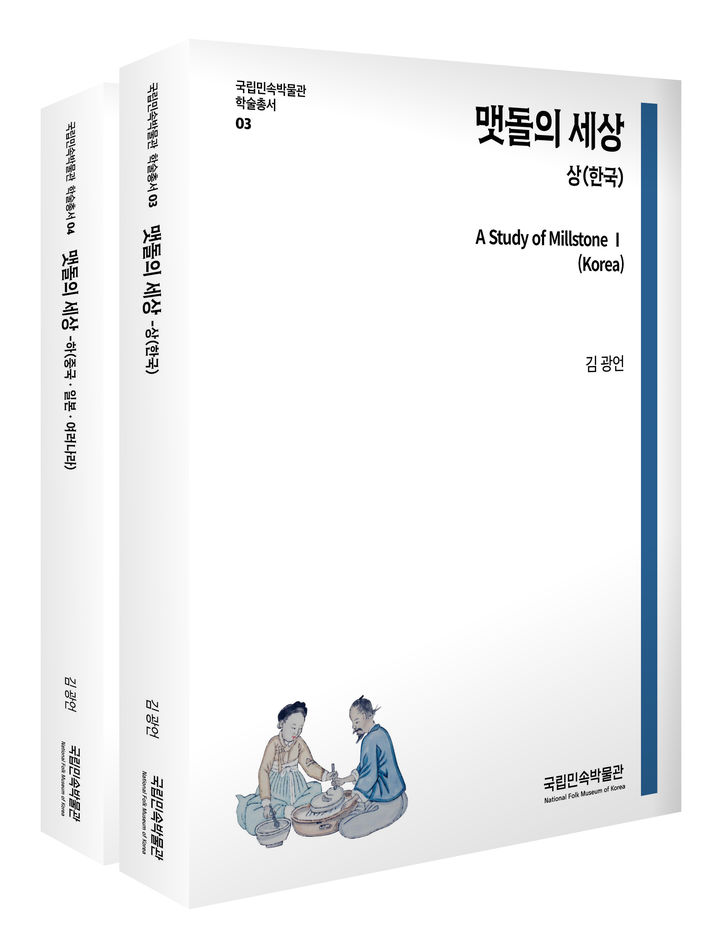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의 맷돌이다. 너른 입을 안으로 가면서 좁히는 동시에 끝을 바깥쪽으로 돌렸다. 그쪽에서 더 잘 갈리는 까닭이다. 맷손 자리에 붙인 ㄷ자꼴 살은, 앞에서 든 도상 386을 닮았다. 맷손이 든든히 박히도록 맷손 자리의 바닥을 안쪽으로 비스듬히 판 것이 돋보인다.
앞과 같은 고장의 것이다. ㄱ자꼴 맷손을 박기 위해 암매 옆구리에 살을 붙이는 외에 홈을 길이로 팠다. 곡물이 흘러내리는 부리는 길고 좁다.
또다른 것은 위에서 본 모양으로, 입은 위가 너르고 깊다. 암매는 입 지름 27㎝, 전 두께 8㎝이다. 받침은 가로 70㎝이며, 부리의 너비는 15㎝이다.
다음은 고창군 아산면 성산리(星山⾥)의 것이다. 석공이 맷손 구멍과 입 사이에 물결무늬 셋을 나란히 새기는 재치를 부렸다. 이제라도 썰물이 일듯하다. 크기는 암매 지름 37㎝에 높이 19.5㎝이며, 입 지름은 9.5㎝이다. 맷손 구멍은 한쪽 길이 7.5㎝에 깊이 3㎝이다.
암매에 옆구리에 맷손을 붙박기 위해 대오리로 엮은 테를 두른 것이 보인다. 이제는 썰물이던 물결이 밀물로 바뀌어 몰려든다.
또다른 맷돌은 수매의 표면으로, 거칠게나마 이를 판 자취가 남았다. 가운데에 박은 수쇠는 긴 그림자와 짝을 이루었지만, 너른 바다에 뜬 작은 배처럼 외롭다.
화산암으로 깎은 부안군 위도면 진리의 전형적인 풀매이다. 암매는 지름 25㎝에 높이 8㎝이고, 부리는 길이 18㎝ 이다. 그리고 받침은 지름 35㎝에 높이 50㎝이다.
맷방석에 앉힌 암매에 대오리로 엮은 두 개의 테를 나란히 둘러서 맷손을 붙박았다(동진수리민속박물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손잡이 끝을 평면으로 깎아서 끼운 것이 보인다. 암매 크기에 견주어 입은 작은 편이다. 크기는 지름 37㎝이고 암⋅수매를 포함한 높이는
22㎝이다.
임실군 임실읍의 맷돌도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강원도 산간지대에서처럼 둥글게 구부린 물푸레나무 덩굴을 암매 옆구리에 메워서 맷손을 붙박은 점이다.
맷돌을 긴 네모꼴 함지에 걸어놓은 굄대에 앉힌 것도 눈에 띈다.
앞 맷돌의 암⋅수매도 보인다. 긴 네모꼴의 구멍에서 시작된 암매의 반달꼴 혀가 뚜렷한 것과 대조적으로, 이(齒)를 세운 자취는 보이지 않는다.
완주군 봉동읍의 것도 있다. 미인의 살결처럼 희디흰 돌을 자연 그대로 부드럽게 다듬은 석공의 솜씨가 놀랍다. 손잡이 쪽의 살을 밋밋하게 올려붙인 것도 마찬가지이다.
진안군 성수면 구신리 맷돌의 암매이다. 한눈에도 몸매가 암팡지다. 입을 너르게 파고 갈린 곡물이 빨리 흘러 떨어지도록 짧은 홈을 비스듬히 붙였다. 수매를 받침과 한 몸으로 다듬은 것도 유별나다. 크기는 암매 지름 32㎝에 높이 11㎝이다.
또다른 맷돌로, 위에서 본 수매 표면이다. 홈을 포함한 세로는 57㎝이고 가로는 49㎝이며, 받침의 높이는 15.5㎝이다. 그리고 홈은 너비 3.5㎝에 깊이 2.5㎝이다. 형태는 물에 불린 콩을 주로 간 것을 알려준다.
무주군 설천면의 것도 있다. 쇠 파이프로 대신한 맷손을 암매 한쪽에 뚫은 구멍에 박았다. 오래 쓰기는 할 터이지만, 지나치게 가늘어 수건 따위를 감고 돌렸을 터이다.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의 풀매이다. 부리의 앞쪽을 길게 구부린 것이 눈을 끈다. 암매 가
장자리에 박은 맷손을 붙박기 위해 생철을 둘러놓았다.
다음은 앞 마을의 한 아낙이 물에 불린 콩을 가는 장면이다. 부리에서 콩물이 주르르 흘러내린다.
김제시 동진수리민속박물관 소장품이다. 암매 바닥의 입은 반듯한 긴 네모꼴이고, 혀는 반달꼴이며, 가운데에 큼직한 중쇠 구멍을 뚫었다. 이(齒)를 판 자취는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어떻든, 아래의 수쇠와 맷방석 모양으로 다듬은 돌 받침을 보면, 벌어진 입이 좀체 다물어지지 않는다. 어떤 석공이 돌을 저처럼 매끄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듬었는가 하는 찬탄을 그치기 어려운 까닭이다. 그 공력으로 말하면 우리뿐 아니라 세계를 통틀어도 견줄 것이 없다. 시집가는 딸의 앞날이 평온하기를 비는 어버이의 애틋한 심정이 빚은 명품인가?
온전한 모양의 맷돌도 있다./이종근기자
'전북스토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선운사 동백나무의 용도는 '방화수림대(防火樹林帶)' (0) | 2025.03.26 |
|---|---|
| 청정한 법수(法水) 청산이 그립다 (0) | 2025.03.24 |
| 전주 풍남문 (0) | 2025.03.17 |
| 이종근, 국가유산청 잡지 월간 '문화유산 사랑' 4월호에 소개 예정 (2) | 2025.03.14 |
| 장수 녹반석과 각섬석암 (1) | 2025.03.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