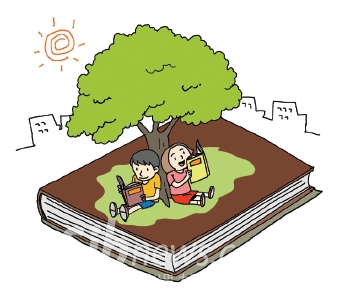
‘풍속은 화순(和順)이요, 인심은 함열(咸悅)이라’ 호남가에 나오는 ‘인심은 함열(咸悅)이다’라는 말이 괜히 생겼겠는가?
‘다 함께 기쁘다’는 함열이란 명칭에 어떤 의미와 역사가 있는 건 당연하다고 여겨서다. ‘홍길동전’의 저자 허균(許筠)은 이곳 함라에서 조선시대 음식 품평서 ‘도문대작(屠門大嚼)’을 썼다. 29세에 장원급제해 황해도 도지사가 되지만 한양 기생을 가까이 했다는 이유로 파직된 것을 시작으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다가 이곳으로 유배를 왔다. 그 때가 광해군 3년(1611년 1월)이었고 그의 나이 43세였다. 그는 1613년까지 이곳에 머물면서 시(詩)·사(辭)·부(賦)·문(文) 등 자신의 옛 글을 정리해 ‘성소부부고(惺所覆?藁)’ 64권을 저술했다.
요즘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았으므로, 그는 옛사람 가운데서 친구를 찾았다. 그가 세든 집에 이정(李楨:1578~1607)이 그려준 도연명, 이태백, 소동파 세 친구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자기까지 포함, 네 친구가 함께 사는 집이라는 뜻으로 사우재(四友齋)라는 편액을 걸었다.
‘아아! 나는 참으로 문장이 서툴러 이 세 군자가 여력으로 하는 문장에도 미치지 못한다. 성품이 또한 예절을 꺼리지 않고 망령되어, 그들의 사람됨을 감히 바라볼 수도 없다. 도령(陶令, 도연명)은 평택에서 80여 일(현령으로) 있다가 벼슬을 그만두었는데, 나는 세 차례나 2천 석 녹봉을 받게 되었지만 기한을 다 채우지 못하고 번번이 쫓겨났다. 적선(謫仙, 이백)이 심양이나 야랑으로 쫓겨다닌 것이나 파공(坡公, 소동파)이 대옥(臺獄) 황강으로 쫓겨다닌 것은 모두 어진 이의 불행이다. 나는 죄를 지어 형틀에 묶이고 볼기 맞는 고문을 받은 뒤 남쪽으로 유배되어 왔으니, 모두 조물주의 장난이다. 괴로움을 (그들과) 같이 겪었건만, (그들이) 하늘로부터 받은 천성은 어찌 나에게 옮겨질 수 없었던가’
그는 이정이 그렸던 세 사람의 초상화를 보면서 사우재의 기문을 신해년(1611) 2월 사일(社日)에 지었다. 허균은 기꺼이 만 권 서책의 좀벌레이기를 원했던 책벌레였다. 서재 이름을 책벌레들인 도연명·이태백·소동파와 친구를 맺고 싶다는 뜻에서 ‘사우재(四友齋)’로 정했고, 혼자만 많은 책을 탐하지 않고 도서관처럼 만들어 지인들과 나눴다.
전주시가 2018년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전주한벽문화관 일원에서 2018 전주독서대전를 개최한다. 이는 ‘대한민국 책의 도시’ 전주의 대표 책 축제로, 한벽문화관과 완판본문화관, 전주향교를 주 행사장으로 펼쳐진다. 장자는 ‘남자란 모름지기 다섯 수레 분량의 책을 읽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남아수독오거서(男兒須讀五車書)’라고 했음을 이번 기회를 통해 체험하기 바란다.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5634
'전북스토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허균(許筠) '남궁선생전(南宮先生傳)' (0) | 2022.06.04 |
|---|---|
| 영원한 절친 이상진과 전동흘 (0) | 2022.06.03 |
| 세 가지 어려운 일 극복한 조삼난(趙三難), 만마관에서 술장사를 하다 (0) | 2022.06.02 |
| 전주 기령당의 편액과 소장 그림 해석하다 (0) | 2022.06.01 |
| 부안 개암사 괘불을 그린 '화승(畵僧)' 의겸 (0) | 2022.06.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