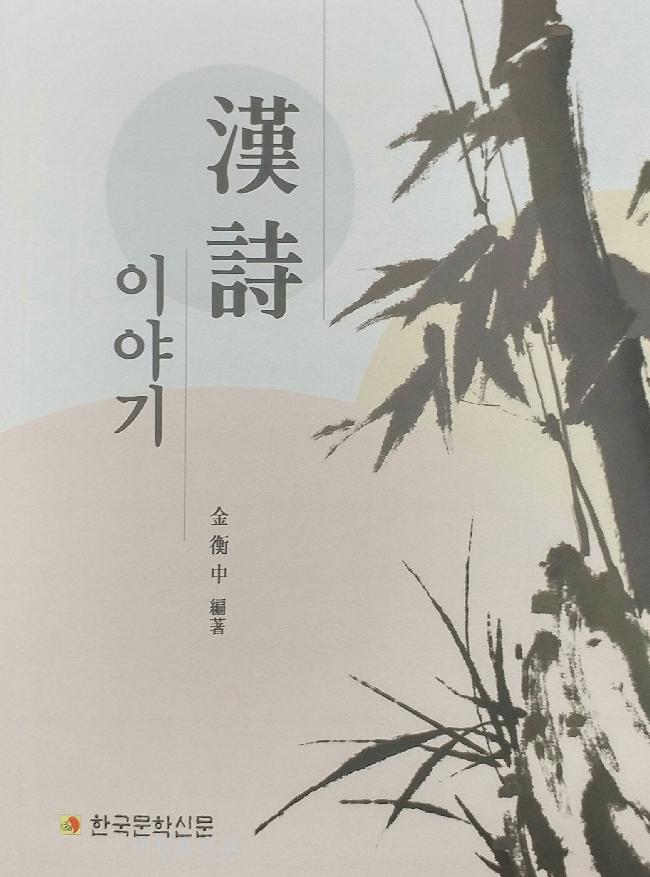
'한시 이야기(지은이 김형중 문학박사,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자문 교수, 발간 한국문학신문)’는 이매창을 비롯 한국작가 12명과 이백을 비롯 중국작가 6명 등 모두 18명의 시인들의 한시를 집중 조명했다. 김시습, 김인후, 김병연과 여류 작가인 황진이(黃眞伊), 이매창(李梅窓), 허난설헌(許蘭雪軒), 선시(禪詩)작가인 진각 혜심, 원감 충지, 백운 경한, 태고국사 보우, 왕사 나옹화상, 서산대사 등 시인이 시세계와 문학 인생에 천착했다.
‘밝은날 강산은 아름다운데/푸른 봄 화초들은 무성하게 피었네/무엇하러 입을 모아 말을 할 거냐/만물들은 본래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강산려 江山麗, 아름다운 강산) 전문)’
조계종 3대 선사인 백운화상은 호는 백운(白雲)이고 법명은 경한(景閑)이다. 고려말 1298년 정읍 고부면 백운마을에서 출생했고 어려서 출가해 구도에 전념했다. 가장 큰 업적은 1372년 역대 선사들의 주요 말씀을 초록해 ‘불조직지심체요절’을 편찬한 것이다. 1377년 그의 제자들이 지금의 청주 흥덕사에서 이를 금속활자로 간행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자본으로, 그 문화적 가치를 공인받아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황진이·이매창·허난설헌은 여류시인으로 그 이름이 드높다. 이들은 사대부 작가들이 표현할 수 없는 한과 기다림과 사랑이라는 독특한 매력을 지닌 가운데 허난설헌은 중국에 까지 이름이 전해졌다. 부안출신의 매창의 러브 스토리는 한을 넘어 차라리 절절하기까지 하다. 매창에게 어느 날 사랑이 찾아온다. 열아홉의 꽃다운 매창에게 스물여덟 살이나 많은 47살의 천민 출신 시인 유희경이었다. 유희경은 서울 사람으로 천민 출신이지만 시를 잘 짓는다고 부안까지 소문이 자자했다. 둘은 처음 본 순간부터 연정에 빠져 시를 주고받으며 풍류를 한껏 즐긴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다. 1592년에 발생한 임진왜란은 매창과 유희경을 갈라놓았다. 유희경은 의병이 되어 매창을 떠난다.
‘이화우(梨花雨) 흩날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낙엽(秋風落葉)에 저도 날 생각는가/ 천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라’ 유희경도 헤어진 매창을 그리워 하기는 매한가지였다. 매창에 대한 그리움을 ‘오동우(梧桐雨)’란 시로 남긴다. ‘그대의 집은 부안에 있고/ 나의 집은 서울에 있어/ 그리움 사무쳐도 서로 못 보고/ 오동나무에 비 뿌릴 제 애가 끊겨라’ 유희경과의 슬픈 사랑을 남긴 채, 매창은 부안에 동고동락하던 거문고와 함께 잠들어있다. 사람들은 이곳을 ‘매창이 뜸’이라고 부른다.
중국출신으론 굴원, 도연명, 왕유, 이백, 두보, 백낙천 등의 시인일 다뤘다. 그러나 구양수와 소식은 지면의 한계로 인해 다음으로 미뤘다. 지은이는 “2011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3년 9개월 동안 105회에 걸쳐 ‘주간 한국문학신문’에 ‘조선시대 한시작가론’을 연재하면서 또다른 세계를 만날 수 있었다”면서 “글로벌시대에 들어와 우리 문화전반에 걸쳐 서구문화로 빨려들어가고 있듯이 시대 상황의 조류를 결코 멀리할 수 없어 ‘한시 이야기’를 펴내게 됐다”고 했다./이종근기자
지은이는 2010년 '수필시대' 등단 후 한국농촌문학회 6대 중앙회장, 한국문예연구문학회 회장, 전북문협 28대 부회장, 행촌수필문학회 8대 회장을 역임했다. 제12회 행촌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시집으로 '어머니의 지게' 외 3권, 칼럼집 '도전하는 사람이 아름답다'외 1권, 수필집 '하얀 흔적들' 등을 펴낸 바 있다.
'BOOK새통'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신정일, '동학의 땅 경북을 걷다' 발간 (0) | 2021.01.25 |
|---|---|
| 군산과 익산 등 지도로 본 ‘한국 중소도시 경관사’ 발간 (0) | 2021.01.25 |
| 임실문화원, ‘임실의 역사 재발견’ 등 책자 3권 발간 (0) | 2021.01.18 |
| 불로거 이종근의 2021-2022년 단행본 발간 계획 (0) | 2021.01.17 |
| '지식공동체 지지배배’, '공감을 넘어 통감으로, 문학으로 잇다' 발간 (0) | 2021.01.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