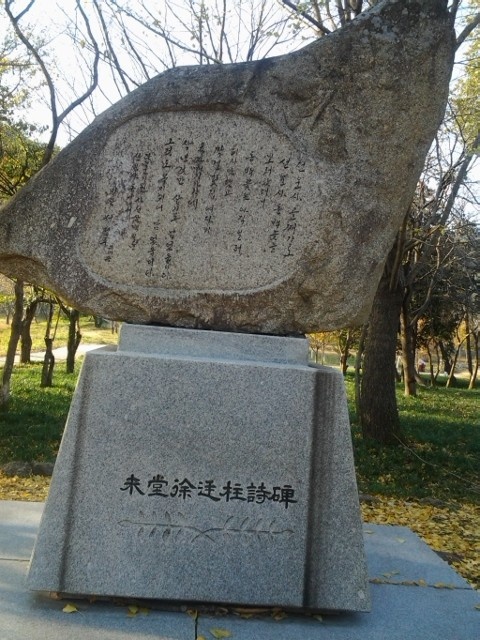



지역문화학회와 고창문화도시추진사업단이 개최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문화발전 모색’을 위한 학술대회'가 27일부터 28일까지 고창 상하목장에서 열립니다.
이종근은 이날 학술세션 3 '지역문화와 치유' 가운데 '지역 산사의 문화콘텐츠화에 대한 절합적 접근 – 고창 선운산 선운사와 문화적 치유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전국조(경성대)'의 토론자로 나섭니다.
발표자 질문은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제가 연구한 내용 토론문에 소개합니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드라마와 문학의 치유 공간’ 선운사에 문화의 힘을
이종근(작가, 새전북신문 편집부국장)
발표자가 원오극근 선사의 게송에 나오는 '도솔'을 통해 선운사 관련 치유 이미지 스토리텔링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 가장 눈길을 끈다.
혹시 선운사 관련 치유 스토리가 더 있다면 소개해주기 바란다.
1.검단선사와 치유
드라마 '대장금'이 마지막 어머니를 위해 산딸기와 복분자를 입에 넣어주고 애틋하게 돌무덤을 쌓아 놓은 용문굴, 연꽃무늬 받침에 나와 같이 평범한 얼굴을 아로새겨 놓은 동불암지마애여래 석가모니 좌상, 날씬하게 하나로 자라다가 달걀처럼 8개의 수장으로 섹시하게 펼쳐진 600년 된 천연기념물 장사송 등을 보면서 왜 선운사가 남도의 내금강이고, 오랫동안 회자되고 사랑받는지를 알 것 같았다.
선운사는 일본에서도 조선 땅의 모든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구원하러 돌아오고자 했던 지장보살의 사연을 비롯, 구원과 나눔에 관한 전설이 많이 깃든 사찰이다.
고통받는 중생을 보살피고 지옥에 들어가서라도 중생을 구제한다는 지장보살과 검단선사의 설화가 웅숭깊다.
선운사에서 멀지 않은 해안가의 검단리는 선운사 창건 설화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선운사는 신라왕 진흥왕이 창건했다는 설과 577년 백제 위덕왕 24년에 검단선사가 창건했다는 두 가지 설이 전해진다. 그 중, 용이 살던 못을 메우고 ‘구름 위에 누워서 참선한다’는 뜻으로 선운사(禪雲寺)를 창건했다 알려진 검단선사의 이야기는 현신한 지장보살과 다르지 않다.
검단스님은 "오묘한 지혜의 경계인 구른(雲)에 머무르면서 갈고 닦아 선정(禪)의 경지를 얻는다" 하여 절 이름을 '禪雲'이라 지었다고 전한다. 그렇다면 이름 자체가 치유를 의미한다고 본다.
그는 빈한했던 지역 사람들을 안타까이 여겨 소금을 굽고 살아갈 수 있는 방도를 가르쳐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은덕에 보답하기 위해 봄과 가을이면 소금을 바치며 ‘은혜를 갚는 소금으로 보은염(報恩鹽)’이라 불렀으며 자신들이 사는 마을의 이름도 ‘검단리’로 했다는 것이다.
현재 염전에서 바닷물을 햇볕에 말려 만드는 소금은 천일염이다. 이 천일염은 조선시대에는 없었던 제조방식으로 만든 것이다. 일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일제강점기 때부터 알려진 방법이다. 그 전에는 달랐다.
구한말까지는 바닷물을 받아서 솥단지에 넣고 장작으로 불을 때서 소금을 만들었다. 이것을 자염(煮鹽)이라고 부른다. 자(煮)는 ‘삶다’ ‘소금을 굽다’는 뜻이다. 장작불로 때서 만든 소금이라고 해서 화염(火鹽)이라고도 한다.
선운사에는 이 자염의 제조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선운사는 이 검단선사가 창건했다고 하는 바, 선운사 터는 원래 도둑들이 살던 도둑 소굴이었다. 검단선사가 이 도둑들에게 소금 굽는 법을 알려주고 이들을 산너머 서해안의 마을로 이주하도록 했다. 도둑들에게 아주 고급기술의 생계수단을 전수해주고 절터를 확보했다. 지금도 해안가 소금을 굽던 마을을 ‘사등마을’이라고 하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1년에 한번씩 동네에서 수확한 소금을 가지고 선운사에 시주한다. 이를 보은염(報恩鹽)이라고 부른다.
검단스님의 창건과 관련, 여러 가지 설화가 전해오고 있다. 본래 선운사의 자리는 용이 살던 큰 못이었는데 검단스님이 이 용을 몰아내고 돌을 던져 연못을 메워나가던 무렵, 마을에 눈병이 심하게 돌았다. 그런데 못에 숯을 한 가마씩 갖다 부으면 눈병이 씻은 듯이 낫곤 하여, 이를 신이하게 여긴 마을 사람들이 너도나도 숯과 돌을 가져옴으로써 큰 못은 금방 메워지게 됐다.
2. 만세루(萬歲樓) 편액와 치유
보물 선운사 만세루(萬歲樓)는 선운사에 전해지고 있는 기록물인 「대양루열기」(1686년), 「만세루 중수기」(1760년)에 따르면 1620년에 대양루로 지어졌다가 화재로 소실된 것을 1752년에 다시 지은 건물이다.
‘만세(萬歲)’라는 말은 불교 자체에서는 그리 많이 사용하는 말이 아니다. ‘천수만세(天壽萬歲)’, ‘왕비전하만세(王妃殿下萬歲)’라는 말에서 보듯이 ‘만세’는 ‘현재의 복락이 영원히 유지되기’를 바랄 때 쓰는 말로 도교적 시간 개념에 가깝다. 예컨대 ‘지금 이대로 죽지 않고 오래 살기’ 또는 ‘현재의 번영이 계속되기’를 빌 때 ‘만세’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 경우, 현재 상황의 연장만이 중요할 뿐, 과거나 미래는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다. 이것은 모든 사상(事象)을 과거, 현재, 미래, 즉 삼세(三世)를 통섭하는 인연법으로 설명하는 불교의 그것과 크게 다른 점이다.
현재 선운사 만세루(전북 유형문화재 제53호), 흥주사 만세루(충남 유형문화재 제133호), 양산 통도사 만세루(경남 유형문화재 제193호), 봉정사 만세루(경북 유형문화재 제325호), 청도 운문사 만세루(경북 유형문화재 제424호), 청송 만세루(경북 유형문화재 제509호), 통영 안정사 만세루(경남 문화재자료 제145호), 불갑사 만세루(전남 문화재자료 제166호) 등 만세루가 문화재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선운사 만세루는 주로 강당이나 법회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뒷면이 대웅전과 마주보며 개방되어 있는 것은 설법을 위한 강당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만세루’ 현판에 걸린 작품에서 치유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아래 세 작품의 연대는 1873년으로 추정된다.
만고에 그윽한 신령스런 구역이여.
어느 때에 이 루를 지었는지 알 수 없구나.
차가운 종소리는 저녁 구름 속 골짜기로 떨어지고,
푸른 노송 그림자는 방초 우거진 물가에 잠기네.
달빛 비치는 맑은 밤에 스님네들 모여 담소하고,
바람 불어 좋은 날이면 나그네 근심 씻어주네.
빛나고 넓고 맑고 고요함이 때를 따라 적절하니,
가히 깨닫기도 놀기에도 모자람이 없도다.
一片靈區萬古幽
不知何世起斯樓
寒鐘聲落暮雲峽
綠會影沈芳草洲
月榭淸宵僧聚話
風欄佳一客消愁
華恢瑩靜隨市適
可以惺惺可以遊(癸酉 端陽節 茂此 金河燮, 현판 7언율시)
빽빽이 들어선 산은 그윽한 경지를 이루고,
대웅전 바깥에는 만세루가 있구나
달빛 아래 승려는 맑은 밤 경쇠를 치고,
구름가의 나그네는 석양에 물을 건너네.
지은 지 오랜 세월 여러 겁을 지냈거늘
오늘에야 올라서서 수심을 사르누나.
대들보의 찬란한 시 진경(眞景)을 읊었으니
고금의 풍류객이 얼마나 와서 놀았던고.
簇簇衆巒一境幽
大雄展外有斯樓
月下僧敲淸夜磬
雲邊長年多閱㤼
登臨此日可消愁
曜樑詩律寫眞景
今古風類幾度遊(癸酉 端陽節 松溪 金寧柳, 현판 7언율시)
맑은 풀과 푸른 노송에 도량은 그윽하고,
높이 솟은 누각에는 구름 그림자 배회하네.
난간밖을 두른 산은 옥계(玉界)요,
문 앞을 흐르는 물은 연꽃섬과 같도다.
벗과 함께 하니 루가 높다 한들 위험할까.
한가히 기대니 고해의 수심 문득 잊네.
늙은 중이 은근히 향기나는 차를 권하니,
아름다운 인연이 음악에 취함보다 더 좋도다.
晴莎錄檜道場幽
雲影徘徊聾一樓
檻外環山皆玉界
門前流水似蓮洲
伴登何有危梯踏
閑倚便忘苦海愁
老釋慇懃勸香茗
雅緣猶勝管絃遊(癸酉 仲春 松史 金德恒, 현판 詩額)
3번째 김덕항의 시에 선운사의 차 이야기가 나온다.(노석은근권향명)
실학자 황윤석(黃胤錫·1729~ 1791)은 자신의 일기 '이재난고'에서 당시 부안현감으로 있던 이운해(李運海·1710~?)가 1755년경에 지은 '부풍향차보(扶風鄕茶譜)'란 책을 소개했다. 이운해는 그때까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이웃 고창 선운사의 야생차를 따와서, 증세에 따라 향약(香藥)을 가미해 모두 7종의 약용 향차(香茶)를 개발했다. 부풍은 전북 부안의 옛 이름이다.
'부풍향차보'는 흔히 차에 관한 최초의 저술로 꼽히는 초의의 '동다송'보다 무려 70여년이나 앞선 의미 있는 저작이다.
3. 윤대녕의 ‘상춘곡’과 치유
윤대녕의 단편소설 `상춘곡(1996년 발표)`에는 "당신이 더 잘 알겠지만 선운사 동백(冬柏)은 실은 춘백(春栢)이지요"라는 구절이 나온다. 3,000여 그루에 달하는 선운사 동백이 실제로 개화하는 시기가 겨울이 아니라 3월부터 4월 무렵이기 때문이다. 스물여섯 살이던 때, 남자와 란영은 선운사에서 사랑을 나눴다고 한다. 긴 시간이 지나 그들은 우연한 계기에 다시 만나게 되고, 남자는 벚꽃이 피면 또 만나자고 한 란영의 말을 떠올리면서 선운사를 찾는다. 그 여학생은 전북대를 다녔다.
"아, 그리고 인옥이 형이 그날 당신에게 했던 말이 생각나 오늘 벚나무길 좌판의 어떤 아주머니한테서 동백기름 한 병을 샀습니다. 나중 어느 날이라도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바뀌면 머리에 한 번 발라보라고 말입니다. 당신 앞산에 벚꽃이 피면 그때 찾아가서 놓고 오지요"
‘상춘곡' 주인공 ‘나’는 선운사에서 만나 깊은 인연을 맺었다가 헤어진 여인을 우연히 다시 만난다. 여인은 벚꽃이 필 때 다시 보자고 했고 ‘나’는 선운사에 미리 와서 벚꽃의 개화를 기다린다. 그러나 벚꽃은 피지 않았다. 기다림에 지쳐 선운사를 떠나려던 ‘나’는 선운사 내의 목조건물 만세루에 얽힌 사연을 듣게 된다. 만세루는 고려 때 불탔는데 다시 지으려니 재목이 없어서 타다 남은 것을 조각조각 이어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다시없는 걸작이 됐다는 것이다. ‘나’는 다시 선운사로 돌아와서 어느 기둥 하나 온전한 것이 없는 만세루를 자세히 들여다본다. 그리고 마치 기적처럼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얗게 흐드러진 벚꽃의 무리를 본다.
‘‘나’는 이제 여인을 만나고자 개화를 기다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나’와 여인이 ‘멀리서 얘기하되 가까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들이’ 됐으며 ‘마음 흐린 날 서로의 마당가를 기웃거리며 겨우 침향내를 맡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된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불에 타 무용해진 나무 조각들이 걸작 만세루의 재료가 됐다는 사실은 불에 탄 옛날을 품고 사는, 관계에 상처받고 좌절한 사람들을 치유한다. 아마도 ‘나’는, 숱한 ‘나들’은 숯이 된 과거를 굳이 놓으려 하지 않고도 살아갈 힘을 얻었으리라’
윤대녕의 소설 ‘상춘곡’에서 위로와 치유의 공간은 만세루이다. 정극인의 상춘곡, 그리고 현실에서 좌절한 사대부들의 상춘곡들에서 위로와 치유의 공간은 아마도 자연이었을 것이다. 수양과 흥취와 풍류와 탈속의 공간, 그리고 홍진에서의 기억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않아도 이상적 삶으로서의 안빈낙도를 꿈꿀 수 있던 공간. 살아가는 시공과 정신세계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전 사대부들의 삶의 지향에 그럭저럭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것은 현대를 사는 우리 역시 각자의 삶에서 어떤 식으로든 좌절하고 또 어떤 식으로든 위로를 구하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리라. 다시, 작품 속의 남자와 란영이 선운사 만세루에서 만난다면 무슨 말을 할까.
불교체험관은 지난 2018년부터 50억 원이 투입돼 2021년 7월 준공됐다. 석전 박한영 스님을 추모하는 전시체험관의 전시물 배치 등을 마무리하고 선을 보이고 있다. 불교체험관은 선운사의 암자인 도솔암 가는 길목 2개소에 자리잡았으며 템플스테이관 인근에 명상·다도체험관과 전시체험관(이하 석전기념관)을 배치해 도솔천의 자연 속에서 치유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선운사 불교 체험관이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에서 나아가 코로나19로 지친 도민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는 치유·문화공간으로 발돋움하기 바란다.
'전북스토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그리운 임이 사는 마을' 전북 임실, 행복한 시간들이 치즈처럼 고소하게 흘러갑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국수 가락이 당신의 지난 삶처럼 정갈합니다 (0) | 2022.05.22 |
|---|---|
| 호남이 있었기에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는 말이 유효하기를 바란다 (0) | 2022.05.22 |
| 여규형의 익주채련곡(益州采蓮曲)과 익산의 연못 스토리 (0) | 2022.05.20 |
| 여규형의 익주(익산)채련곡 (0) | 2022.05.19 |
| 부안 타루비의 주인공 이유, 그의 행적 한글로 번역 (0) | 2022.05.16 |


